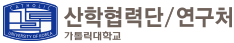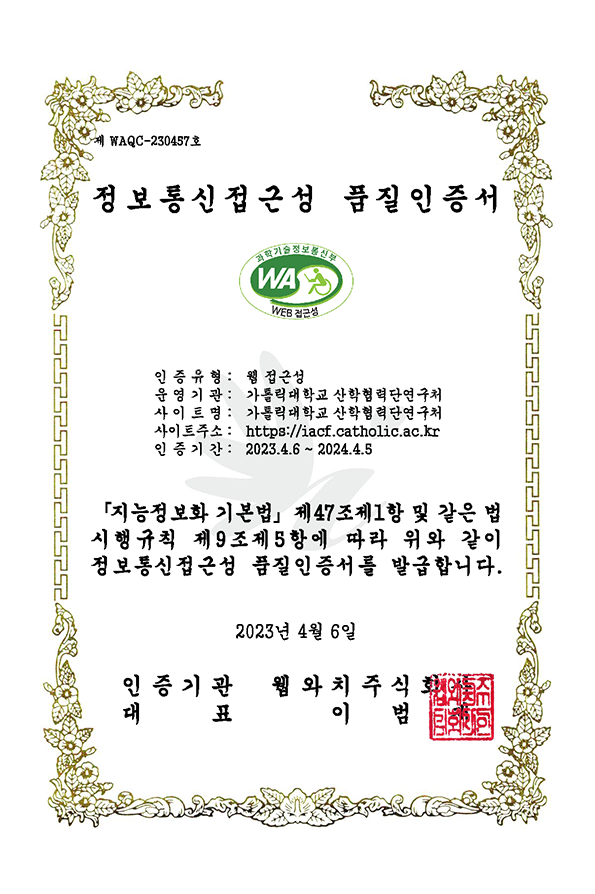□ "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고삐 죈 새 정부, 디지털헬스엔 기회의 창”
◉ 법무법인 세종,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정책 전망 보고서 발간...제약ㆍ바이오 사회적 책임 강조, 건보 재정 규제 강화
- R&D 투자 시 공공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함.
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의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함.
-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,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체계 구축 및 지역의대·국립대병원 중심의
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함.
- 이 외에도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, 방문진료 확대, 주치의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 등도 기대할만한 정책 변화로 꼽음.
□ 새 정부 '바이오 육성 정책' 주목···산업계 촉각
◉ 국가 전략산업 규정···R&D비용 연동 약가보상·환자 부담 경감 RSA 확대
-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제약·바이오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, 정부 주도 투자 확대를 천명했으며, 구체적으로 성과 중심의
전략적 R&D 시스템 구축과 연구 성과는 국민 환원 구조의 공공환원형 R&D 체계를 강화하며 100조원 규모 민관 바이오 특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.
- 특히 인공지능(AI) 등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신약 개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,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등
국가 차원 AI-바이오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함.
- 지역 전략의 경우 수도권 홍릉·상계 일대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육성하고, 인천·시흥·송도는 글로벌 바이오 생산·연구 거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임.
2. 기타 공유사항
□ 첨단기술 5위 강대국 한국…바이오는 인도ㆍ호주에 밀려 10위
◉ 바이오협회 보고서, "공공 R&D 투자+민간 혁신으로 바이오 강국 부상…美ㆍ中 격차 적은 '2강 대결'
-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최근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가 인공 지능(AI), 바이오, 반도체, 우주 및 양자 등
5개 주요 첨단기술에 대한 25개국의 국가 순위를 평가한 '핵심 및 신흥 기술 지수(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dex)에 따르면
한국은 아직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자본을 바이오 강점으로 전환하지 못했지만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관심을 감안할 때 주목해야 할 국가라면서
지속적인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와 민간 부문 주도의 혁신으로 바이오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다고 평가함.
-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5개국 중 바이오10위를 비롯해 인공지능(AI) 9위, 반도체 5위, 양자 12위, 우주 13위로 평가되고 있음.
- 한국 정부는 바이오를 핵심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오는 2035년까지 세계 5대 선진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□ “이게 웬 ‘줍줍’ 찬스?”…하버드발 인재 탈출 러시에 국내 대학들 모셔가기 전쟁
◉ 美행정부와 하버드대 갈등틈타 교수·연구원·학부생 유치나서
-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고 각종 연구비를 삭감하자 미국을 떠나는 연구자와 학생이
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대학들이 미국 인재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.
- 9일 교육계와 대학가 등에 따르면 고려대는 최근 미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수나 학생을 위해
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, 연세대와 KAIST도 인재 유치전에 뛰어들었음.
- 정부도 국내 대학들의 인재 유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음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 4대 과학기술원에 박사후연구원 같은 신진연구자 400명의
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음. 이 중 약 30%인 120명 정도를 해외에서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특히 미국 보스턴과 실리콘밸리에 있는 해외 인재를
집중 공략할 예정임.
□ 사업화 미미…실험실 떠나면 버려지는 '韓 R&D'
◉ 지난해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는 ‘네이처 인덱스 2024 한국 특집호’를 통해 “한국의 연구개발(R&D) 성과는 예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낮다”는 혹독한 평가 제시
-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(GDP) 대비 R&D 비중은 4.96%로,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·민간 영역의 R&D 투자 규모는
12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나,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과 사회에 뿌리내리는 사례는 많지 않음.
- 기술사업화는 보통 ‘기술이전→시제품 제작(파일럿 테스트)→실증·인증→시장 적용(양산·판로 확보)’ 과정을 거치지만, 국내에서는 기술이 실험실을
떠난 직후부터 버려질 위기에 처함.
- 기술사업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전담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, 공공연구기관에는 기술이전전담조직(TLO)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제한적이며
기술이 연구 현장을 떠난 후 ‘이어달리기’가 되지 않고 사장되는 이유임.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